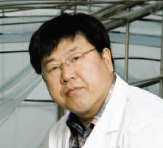맥이 끊긴 전문 육종연구 이에 따라 신품종 육종과 관련해 국내 대학교 및 연구기관이 기업과 함께하는 합동 프로젝트가 거의 사라진 상태이다. 많은 신기술과 신품종이 시장에 소개도 되지 못한 채 연구 성과로만 남아있게 되고 한국 전체의 육성기술 자체가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점차 외국에 뒤쳐지고 있는 형편이다. 또한 생물학이나 유전공학 등 연관학문과의 연계도 잘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육종연구분야를 지원할 만한 산업체가 줄어들면서 관련분야를 전공한 학생들은 취업하기가 매우 어려워지자 종자를 개발하는 육종은 사실상 비인기직업이 됐다. 농업이 3D업종에 속하다 보니 이에 뛰어드는 젊은 인재들도 사실상 찾아보기가 힘든 형편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개인 육종가를 지원하는 정책들을 속속 내놓고 있지만 아직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다국적기업의 종자 독점 두 번째로 종자의 경우 다국적회사가 특정 품종에 대하여 한번 독점을 하게 되면 이런 독점을 쉽게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종자시장의 60%이상이 외국기업에 선점된 상태이며 우리 종자업체들이 종자 주권을 되찾는 것 또한 쉽지 않다. 왜냐하면 종자는 1년 농사를 좌우하므로 농민들은 특별한 이유 없이 심던 종자를 다른 것으로 잘 바꾸지 않으며 같은 종자라 해도 기후나 환경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규로 도입되는 종자는 정확한 재배법을 모르는 상태이고 이전에 심던 종자는 재배특성을 잘 알고 있으므로 사실상 정확하게 재배하면 신 종자가 더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전품종에 맞는 재배법을 사용해 신종자의 가치를 확인하지 못하게 된다. 이처럼 특정 품종에 대한 독점은 쉽게 바뀌지 않으며 미래에도 계속적으로 종자를 외국에 의존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것 또한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LMO’ 신품종 육성 주도 우선 유전자조작기법을 이용한 LMO가 새로운 품종 육성의 주가 될 것이다. 유전자조작기법은 지금까지의 재래적인 육종방법으로는 만들 수 없던 획기적인 능력을 가진 품종을 육성할 수 있어 미래의 주요한 육종방법이 될 것이다. 현재 미국 등지에서 개발돼 있는 LMO의 경우 대부분 내병성 유전자가 도입된 것으로 그 관리 면에서 매우 탁월해 비용감소효과가 매우 크므로 전 세계적으로 보급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LMO를 유전자변형보다는 유전자조작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해 일반인으로 하여금 거부감을 가지게 해 이에 대한 연구가 아직 미약한 형편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LMO를 하려면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다. 미국이나 중국은 정부에서 적극권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한국경제신문(2008년 7월11일 A10)을 보면 중국도 향후 200억위안(약3조원)을 투자해 GMO대국화를 시도한다고 돼 있다. 현재 중국은 6종의 유전자조작 쌀이 마지막 안전성시험에 들어가 있다고 발표했다. 기능성 신품종 육성 ‘화두’ 이렇게 지금까지 많은 신품종이 개발됐으며 그 개발 방향은 시대에 따라 조금씩 변해왔다. 과거에는 생산량이 많고 품질이 좋은 것이 우선시 됐다. 하지만 집약적 농업이 발달하고 농업이 산업화하면서 병해로 인한 피해가 많아졌고 이에 내병성이 신품종개발의 중요한 대상이 됐다. 최근에 와서 옥수수 수염차라던가 자일리톨껌 등 특정성분을 목표로 한 기능성 식품이 발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능성 신품종의 육성이 화두가 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국내 종자업체들의 규모가 영세하고 규모가 큰 종자업체의 경우 외국으로 넘어가버려 이 분야에 대한 연구는 거의 진행되고 있지 않다. 신품종을 개발하려면 고도의 전문지식, 기술, 경험, 토지, 자본, 종자재료 등 많은 시간과 경비가 소요되므로 개인육종가나 신생종자업체가 신품종을 개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